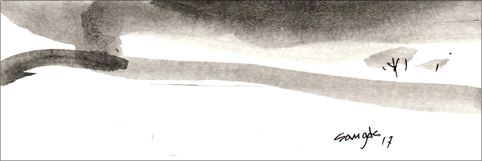
전화 벨소리가 울린다. 고요했던 정적이 깨진 탓인가 좋지 않은 예감이 순간적으로 스쳐지나간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반가운 인사가 먼저였을 텐데 가라앉은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
“왜, 무슨 일?”
직감으로 내뱉은 반문에 침울하게 울려오는 그의 말. 한 사람의 부음이었다. 순간 내 몸의 기운이 어딘가로 추락하듯 아득해진다. 흐르는 시간이 한순간 정지된 느낌에 대꾸할 말조차 생각나지 않는다.
아내가 가출을 해버린 뒤 삶의 균형이 얼음장 깨지듯 조각나버린 그가 충격으로 쓰러진 게 얼마 전이었다. 뇌일혈이란 단어가 우리의 주변에, 그것도 한창 나이에 찾아왔다는 것이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 결국 몇 개월 병실에 누워 있던 그가 말 한 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나버린 분명한 현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다.
“살아서 뭐하게요. 차라리- ”
이어진 말은 비장의 극단이다. 의식이 돌아올 가망은 없고, 오로지 식물인간으로 연명해야 한다면 살아갈 이유는 없다는 뜻이 슬픈 분노로 변해 있다. 그 분노의 원인이 떠난 자에게 보내는 연민이었음을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지친 듯 쓰러져 잠을 잤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우선적 나태가 때아니게 수면을 불러왔는지도 모른다. 조금 있어 정신을 차리면 그의 영정 앞으로 가야한다. 그 예정된 수순이 괴로워 지레 지쳐버린 탓이었을까. 핑계 같았지만 참으로 깊은 낮잠이었다.
떠난 사람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술잔을 든다. 함께 한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는 대체로 우울하다.
“다 잊어버리니 좋겠다.”
고통은 현실이라는, 살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냉소 섞인 푸념으로 대화들은 오고간다. 살아가면서 쉽게 잊히지 않고 쌓이는 것들, 그러므로 잊고자 한 것들은 분명히 고통이 빚어내는 결과들이다. 고통을 이기는 약은 당연히 잊어버린다는 것이겠지만 길 떠나는 그가 잊고 가는 무게는 얼마쯤이 될까 문득 궁금해졌다.
(그래, 다 잊어라.)
그 무게 때문에 생각난 말이었다. 입 밖으로 소리 내지는 않았지만 툴툴 털고 가기를 빌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가만히 앉아서 유리창에 얼룩지는 빗방울을 본다. 며칠 전 떠나버린 사람에게도,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내리는 비다. 그 의미는 다르겠지만 세상의 이치, 삶의 법칙은 변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상심에 지쳐있을지라도 아랑곳없이 시간은 흐른다. 언젠가는 그 상심도 씻기고 남아있는 연민도 지워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내게 남아 있는 통증이 있다. 육체와 정신이 뒤엉킨 이 통증은 내가 살고 있다는 확인의 일부분이다. 이 비는 언젠가 그치겠지. 찔레꽃은 조화처럼 피기 시작하겠지.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푸르러 지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