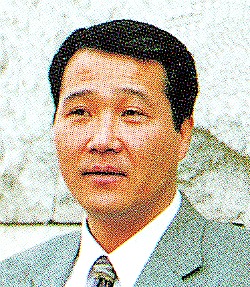
한동안 출근길에 버스정류장에 걸어가기가 괴로웠다. 목도리와 장갑 외투로 감쌌지만 몰아치는 찬바람을 막을 수 없었다. 어른 체면에 귀마개까지 할 수가 없어 귀가 떨어져 나갈듯해서 주머니에 넣어 따뜻해진 장갑 낀 손으로 몇 번이고 귀를 싸잡아 비비기도 했다. 체감온도로는 영하 20도에 가깝다고 하지만 추위에 쩔쩔매는 모습이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웠다. 그럴 때마다 어린시절 시골에서 한 겨울 마을 앞 냇가물이 꽝꽝 얼어붙었다가 봄이 와야 겨우 풀렸던 풍경을 떠올리면서 ‘그때가 더 추었지만 이렇지는 않았다’며 혼자 실없는 웃음을 머금었다.
어린 시절의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추웠다. 내 주관적 경험이지만 추위에 대한 기억만큼은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물은 영하에서 열기 시작해 기온이 떨어질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그러니 요즘의 강물과 그 시절의 강물을 비교하면 내 기억이 잘못된 것 같지 않다. 도시의 하천은 따뜻한 하수와 폐수가 흘러들고 수질이 오염돼 가늠하기 쉽지 않겠지만 내 고향 순창의 하천은 아직 그런대로 비교할 만 할 테니까.
더구나 양말과 신발, 옷과 장갑 목도리 등의 품질을 옛날과 비교해 봐도 그 차이를 쉽게 알수 있다. 내 어린 시절에는 토끼털 귀마개나 털실 장갑조차 구경하기 힘든 시절이었다. 나일론 양말과 고무신 합섬섬유 옷이 그나마 추위를 감 쌀 수 있는 것들이었다. 요즘처럼 캐시미어가 다량으로 섞인 고급 모직 옷이나 거위 털 오리 털이 들어간 고급 방한복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추위에 움츠러지지 않았다.
손 발이 얼어붙도록 산과 들을 헤매며 뛰어다녔다. 얼음을 지치고 연을 날리고 팽이를 쳤다. 한 겨울 마을 뒷산으로 땔나무를 하러 다니기도 했다. 날씨는 춥지만 뛰어노는데 정신이 팔려 추위를 겁낼 틈이 없었다.
생활하면서 실제로 느끼는 기온을 체감온도라고 한다면 그때의 체감온도는 한 겨울에도 영상이었던 셈이다. 이런 기온 감각은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이상 기온과 지구 환경이 가져다 준 기상 한파는 그래도 참을만하다. 문제는 서민 경제적 한파가 이미 경고 수준을 넘어 위험 수준이라는 데 있다.
도시민도 농촌의 농민들도 계속되는 불황과 실직, 지역의 공동화 등 점점 가속화 고착화되는 경제적 고통에 힘겨워하고 있다. 치솟는 물가는 이미 장바구니 경제라는 절약으로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줄일 것은 남아나지 않았다. 그러나 살아야 한다는 자조는 결국 이런 때일수록 주관적 체감온도라도 끌어올려 경제적 한파와 맞서야겠다는 다짐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