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박미선 풍산초 학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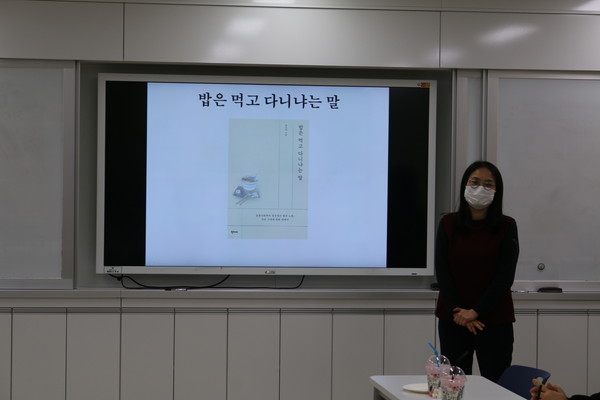
‘책과 함께하는 풍산초등학교 학부모연수’가 지난 15일 농촌사회학 연구자이며 <대한민국 치킨展> <그렇게 치킨이 된다> <아스팔트 위에 씨앗을 뿌리다-백남기 농민 투쟁 기록>의 정은정 작가를 모시고 열렸다. 나주에서 강연을 마치고 순창으로 바삐 걸음을 옮긴 정은정 작가는 작년 풍산초 아이들의 그림책 전시에서 인상 깊었던 책과 어린이 작가를 기억하고, 자리에 참석한 그 부모님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작가의 새로운 에세이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의 북토크는 단순한 먹거리 이야기가 아닌 밥과 노동, 우리 시대의 삶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했다.
강연 내용은 △1980~90년대 젓가락이 필요 없을 정도의 식사를 하던 여성 노동자와 3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끼니 걱정하는 사람들의 존재 △정과 온기를 나누는 한 끼를 원하는 농촌의 어르신에게 마을회관이 갖는 의미 △공깃밥 한 공기에 300원의 쌀값을 보장받기 위한 긴 싸움과 작물을 갈아엎는 농민들을 위해 상주의 울음소리보다 크게 울지 말라는 옛말처럼 시간을 두고 그 아픔을 헤아리기 △농민과 주부로 두 개의 삶을 사는 여성 농민과 ㄱ자로 굽은 허리에도 일을 놓지 못하는 시골의 어머니 △채식의 대세로 생계를 위협받는 고기에 기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 귀하게 기르고 덜 죽여서 아끼며 먹을 수 있는 육류 문화의 필요 △우리네 삶의 공간인 농촌에 작은 규모라도 학교가 필요한 이유 △농촌 일손의 큰 역할을 하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 △내 아이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얼굴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학교 급식 조리원 △‘심어야 거둔다’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확 체험의 필요성 등 상생과 공생의 이야기로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청소년들에게 음식에 얽힌 추억과 기억이 많이 남기를 원해서 음식 이야기를 자주 한다”는 정은정 작가가 풀어낸 기억 속 음식 이야기가 우리네와 별반 다르지 않음에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을 읽은 소감을 묻는 말에 한 학부모는 “책을 읽고 반성했다”며 부끄러움을 고백했다.
“출하를 포기하고 갈아엎는 논과 밭, 전염성 병원균 위험지역의 살처분되는 가축들의 뉴스를 보면서 나 또한 책 속의 도시민들과 같은 생각을 했다. 자식 키우듯 길러낸 결과물을 포기하는 당사자의 소리 없는 통곡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뒤엎을 거면 차라리 지역센터에 기부하지, 저렇게 파묻으면 그 오염은 어쩌려고’라는 어설픈 오지랖의 내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다. 15년 가까이 농촌에 살고 있지만, 귀농이 아닌 귀촌이라는 이유로 아직도 농촌을 도시민의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부끄러움이 너무도 커졌다.”
또 다른 참가자는 “농촌이 겪고 있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을 도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볍지만 깊이 있게 풀어주어서 작가님께 감사하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 몰랐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주셔서 좋았다”는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나와 내 아이, 우리 가족의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누군가의 정성과 땀과 삶으로 일구어낸 귀한 것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였다. 두 시간 남짓 열띠게 진행된 강연은 정은정 작가와 풍산초 졸업생·재학생 학부모, 김명신 교장 선생님과 교직원,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낸 밝은 에너지가 다 같이 나누었던 연잎밥의 은은한 향과 더불어 늦은 가을날의 좋은 기억으로 남을 풍산초 학부모연수의 시간이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감히 ‘밥을 먹는 자’라고 답하고자 한다는 정은정 작가 말에 “밥은 먹고 다니냐?”에 담긴 ‘밥’의 수많은 의미를 헤아려 보며,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



